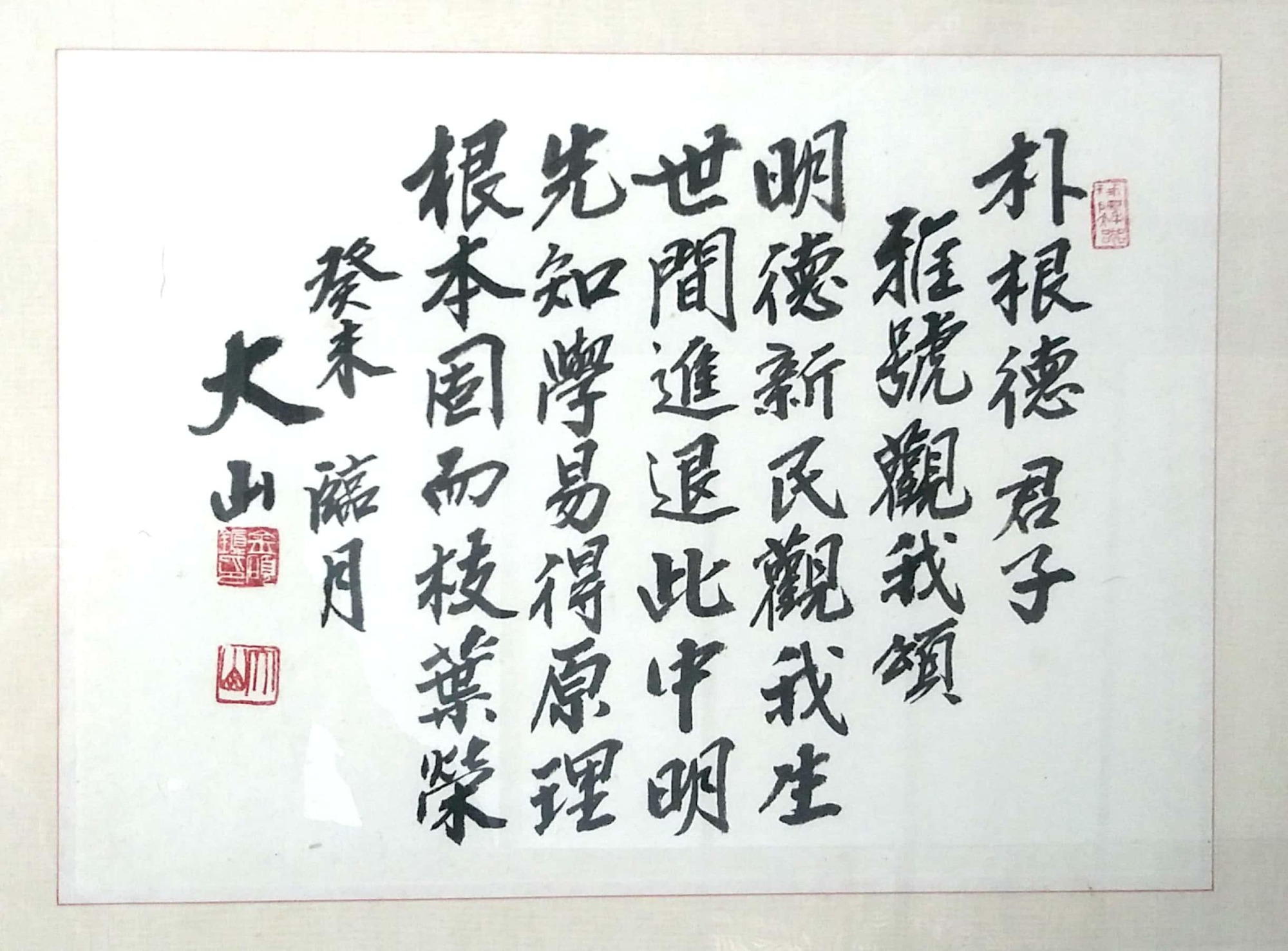Guanah觀我Story
집에 굴러다니는 책 정리하기 033 : 꽃이 문득 말을 걸었다 본문

책소개
이것이 꽃의 연작이다
꽃이 말을 걸었는지
내가 말을 걸었는지
다만, 여러 초상들이 말 속에
피었다 졌다.
사회학자 송호근에서
소설가 송호근으로의
본격적인 도정道程
연작소설 『꽃이 문득 말을 걸었다』
『꽃이 문득 말을 걸었다』는 사회학자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해 온 송호근의 연작소설집이다. 사회학 이면에 품어 왔던 송호근의 심층적이고 다채로운 문학적 지형을 송호근만의 간결한 문장으로 풀어냈다. 날카롭고 치밀했던 그의 사회적 시선은 이번 연작소설을 통해 ‘꽃’이 말을 거는 혹은 ‘꽃’에게 말을 거는 내밀한 문학적 시선으로 그 반경을 더욱 확장했다. 사회학자 송호근에서 소설가 송호근으로의 본격적인 도정, 그 분명한 보폭을 연작소설 『꽃이 문득 말을 걸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꽃이 피고 지는 순간
각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송호근의 연작소설 『꽃이 문득 말을 걸었다』는 꽃이 피고 지는 순간, 잊을 수 없는 기억과 사건을 함축적으로 포착해 여섯 편의 이야기로 풀어낸다. 단편마다 등장하는 다양한 꽃과 그 형상은 각 인물의 삶과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밀착되어 겹겹이 포개지는데 송호근만의 간결한 문장으로 밀도 있게 그려진다. 소설 속에서 목도할 수 있는 목련의 낙화, 만발하는 감자꽃 그리고 어깨 위에 분분히 떨어져 내리는 꽃잎의 정경은 눈이 부셨던 기억의 조각들이자 다시는 거슬러 잡을 수 없는 시간의 또 다른 형상인 것이다.
그때 몰랐던 것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모른다
소설 속에서 ‘채민’과 ‘명준’ 그리고 ‘석희’가 간직했던 어떤 물음에 끝내 답을 찾을 수 없는 이유도, ‘준성’과 ‘정훈’이 현실이라는 반경에서 떨어져 자연을 마주하는 까닭도 각자에게 주어진 물음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바로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 그 물음은 낙화의 순간처럼 “잊힌 것이 아니라 묻힌 것”으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우리의 “어깨 위에 내려”앉는다.
송호근 문학이 ‘기억’에서 비롯되고 그 ‘기억’이 현실에서 맞물려 진행되는 점은 바로 꽃이 ‘지는’ 지점, 삶을 돌아보게 되는 ‘중년’이라는 그 시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꽃이 피고 지는 일에 어떤 이유도 없는 것처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서 ‘모른다’는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일이 송호근 문학의 새로운 스타일이 아닐까.
저자

포스텍 석좌교수.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학자. 정치와 경제를 포함, 사회 현상과 사회 정책에 관한 정교한 분석으로 널리 알려진 학자이자 칼럼니스트로, 2020년까지 〈중앙일보〉에 기명칼럼을 만 17년 동안 썼다. 1956년 경북 영주 출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1989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춘천 한림대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1994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임용되어 학과장과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1998년 스탠퍼드대 방문교수, 2005년 캘리포니아대(샌디에이고) 초빙교수, 2018년 서울대 석좌교수를 지냈고, 현재 포스텍 인문사회학부에 재직 중이다. 대표작으로 20세기 한국인의 기원을 탐구한 탄생 3부작, 《인민의 탄생》(2011), 《시민의 탄생》(2013), 《국민의 탄생》(2020)을 펴냈다. 1990년대에 민주화와 노동문제를 분석한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1991)을 시작으로 《열린 시장, 닫힌 정치》(1994), 《시장과 복지정치》(1997), 《정치 없는 정치시대》(1999) 등을 펴냈다. 이후 IMF 초기 외환위기를 맞은 사회학자의 비통한 심정을 담은 《또 하나의 기적을 향한 짧은 시련》(1998)을 냈으며, 현장 르포 《가 보지 않은 길》(2017)과 《혁신의 용광로》(2018), 소설 《강화도》(2017)와 《다시, 빛 속으로》(2018) 등을 출간했다.
목차
작가의 말
목련꽃 그늘
산벚꽃 바람
하얀 감자꽃
동자꽃 붉은 꽃잎
능소화 넝쿨
매화꽃 밀화
- 소나무 사랑
- 향석 마을 가는 길
- 매화꽃
책 속으로
논리의 온상에서 문학이 움트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땅 속 씨앗의 생존력은 끈질겼다. 기질인가, 허기인가. 마당에 아무렇게나 널린 나무들이 계절마다 움트고 꽃피우고 조락(凋落)하는 장면을 붙잡고 싶은 충동이 동시에 일었다.
- 작가의 말 중에서
인간이 미성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계몽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진행되어 갈, 미완의 것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미성년의 상태에 있을 것이다. 단지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태도 속에서 부재의 형태로만 성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성년에 도달했다는 착각이 오히려 그러한 엿봄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영원한 미성년의 존재일 것이다. 송호근의 문학은 필자에게 이런 물음들을 환기시켜 주었다.
- 성민엽(문학평론가), 작품 해설 중에서
어둠이 봄 냄새를 싣고 중년이 된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22쪽)
삼십 년 세월이 지나도 답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답을 내려도 손이 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움을 안은 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61쪽)
떠난다고 아무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마음을 할퀸 갈퀴가 남아 새로운 상처를 내고야 마는 게 사랑이다. (86쪽)
합류는 곧 상실로 나타나요. 흘러가 버리니까. 기존의 흐름으로 복귀하지 못하니까. 기존의 물줄기는 만남과 더불어 새로운 물줄기로 변하죠. 소멸과 생성이 반복되는 곳이 여기예요. 그 경계선, 변방. (93쪽)
서로의 결핍을 확인하는 순간 사랑은 미늘처럼 덫이 되고 상처를 남긴다. 덫에 갇힌 채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막다른 선택인가. 아니면 불행의 예감을 불꽃처럼 간직한 채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98쪽)
일렁이는 바람결에 매화꽃잎이 흰 눈처럼 날리는 풍경 속으로 정우는 휘청거리며 걸어 들어갔다. 나무 우듬지가 흔들리자 시나브로 떨어지는 꽃잎 휘장에 매실나무 둥치가 거뭇거뭇했다. 민머리 어머니가 마치 헤엄을 치는 듯했다. 그 형상은 곧 청매실 나무로 옮겨 붙었다. (294쪽)
'도서圖書Book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집에 굴러다니는 책 정리하기 035 : 소중한 것을 먼저하라 (0) | 2024.02.21 |
|---|---|
| 집에 굴러다니는 책 정리하기 034 : 전자기 쫌 아는 10대 (0) | 2024.02.17 |
| 집에 굴러다니는 책 정리하기 032 : 아름다운 반칙 (0) | 2024.02.14 |
| [금주의 서평 665호] 온라인 혐오 대항을 위한 문지기 시민의 책임새창으로 읽기 (0) | 2024.02.08 |
| 이달의 책 소개 (봄내 397호, 2024년 02월) (0) | 2024.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