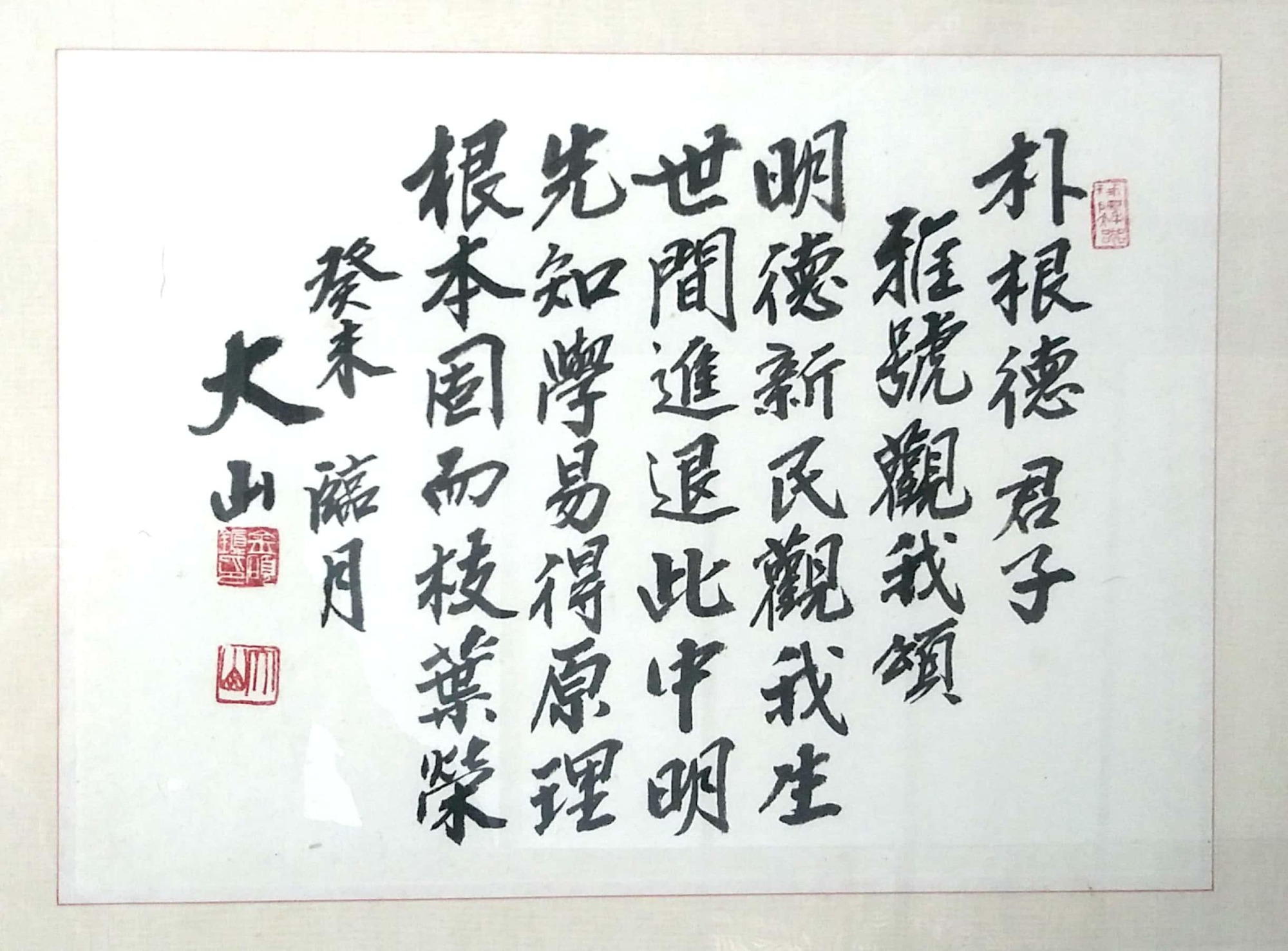Guanah觀我Story
[박제영의 꽃香詩향] 꽃다지 본문

< 월간 《춤》, 2024년 3월호 >
오늘은 우리나라 아동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자연을 파괴하는 문명의 횡포를 비판한 사상가이자, 전쟁을 반대하고 통일을 염원한 평화주의자이자, 교회의 잘못을 꾸짖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했던 故 권정생(1937~2007) 선생님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해방 직후 우리나라로 돌아오셨지요.
경북 안동 일직면에서 마을 교회 종지기로 일하셨고, 빌뱅이 언덕 아래 작은 흙집에서 사셨습니다.
그곳에서 전쟁과 가난 때문에 얻은 병마와 싸우면서 작고 약한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 많은 작품을 발표하셨습니다.
『강아지똥』, 『몽실 언니』와 같은 동화는 워낙 유명하지요.
그중에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선생님의 산문집 『빌뱅이 언덕』(창비, 2012)에 실린 「자유로운 꼴찌」입니다.
짧은 산문이라 전체를 읽어드리고 싶지만, 부득이 꼭 필요한 문장만 옮깁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죽는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죽는다.
그러니 절대 앞서지 말자는 것이다.
그리고 뒤쳐져 있다고 불행하다는 생각도 하지 말자.
작은 꽃다지가 노랗게 피어 있는 곳에도 나비가 날아든다.
작은 세상은 작은 대로 아름답다.
// 드넓은 밤하늘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는 데 아직 돈 내라 소리 없지 않은가.
가난한 사람에게도 우주는 그만큼 너그럽다.
- 권정생, 「자유로운 꼴찌」 부분, 123쪽
가끔 삶이 지칠 때면, 사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아플 때면, 권정생 선생님의 산문집을 꺼내 읽습니다.
- 권정생, 「자유로운 꼴찌」 부분, 123쪽
가끔 삶이 지칠 때면, 사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아플 때면, 권정생 선생님의 산문집을 꺼내 읽습니다.
그러면 선생께서 “괜찮다, 괜찮다.” 하시며 어깨를 두드려주는 듯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위로가 필요하다면 선생님의 산문집 『빌뱅이 언덕』이나 『우리들의 하느님』을 추천해주고 싶네요.
분명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야기가 옆으로 샜습니다.
작고 낮은 앉은뱅이 꽃들 중에서도 작고 낮기로 치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꽃.
그야말로 코딱지만 하다고 해서 코딱지나물로 불리기도 하는 노란 꽃.
오늘은 그 꽃다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꽃다지 하면 사실 저는 제일 먼저 떠오는 것은 민중가요 <꽃다지>(김호철 작곡/ 김애경 작사)입니다.
꽃다지 하면 사실 저는 제일 먼저 떠오는 것은 민중가요 <꽃다지>(김호철 작곡/ 김애경 작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그리워도 뒤돌아보지 말자
“그리워도 뒤돌아보지 말자
/ 작업장 언덕길에 핀 꽃다지
/ 나 오늘밤 캄캄한 창살 아래
/ 몸 뒤척일 힘조차 없어라
/ 진정 그리움이 무언지
/ 사랑이 무언지 알 수 없어도
/ 퀭한 눈 올려다본 흐린 천장에
/ 흔들려 다시 피는 언덕길 꽃다지
// 눈감아도 보이는 수많은 얼굴
/ 작업장 언덕길에 핀 꽃다지
/ 나 오늘밤 동지의 그 모습이
/ 가슴에 사무쳐 떠오르네
/ 진정 그리움이 무언지
/ 사랑이 무언지 알 것만 같아
/ 퀭한 눈 올려다본 흐린 천장에
/ 흔들려 다시 피는 언덕길 꽃다지”
봄날, 들에 산에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꽃다지.
봄날, 들에 산에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꽃다지.
보는 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다른 사연을 전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약자들,
민초를 상징하고 대변하는 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민초에 해당하는 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노해를 비롯해 많은 시인들은 민들레를 꼽고 있는데,
오랑캐꽃(제비꽃), 패랭이꽃도 빼놓을 수는 없을 테지요.
그렇다면 「사평역에서」로 유명한 곽재구 시인의 시 「세월」과 제25회 백석문학상을 수상한 송진권 시인의 시 「나의 월인천강지곡」을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얀 민들레 곁에 냉이꽃
냉이꽃 곁에 제비꽃
제비꽃 곁에 산새콩
산새콩 곁에 꽃다지
꽃다지 곁에 바람꽃
소년 하나 언덕에 엎드려 시를 쓰네
천지사방 꽃향기 가득해라
걷다가 시 쓰고
걷다가 밤이 오고
밤은 무지개를 보지 못해
아침과 비를 보내는 것인데
무지개 뜬 초원의 간이역
이슬 밭에 엎드려 한 노인이 시를 쓰네
― 곽재구, 「세월」 전문
내가 길 잘 든 순한 짐승 같은 붓도랑물 데리고
거뭉가니 들판을 가면
물 가둔 논마다 월인천강 월인천강
달이 들어앉아서 몸을 부풀리며 숨을 몰아쉬기도 하다
뽀드득 낯을 씻어내는 거뭉가니 들판을 가면
내가 쫑알쫑알 지껄이는 딸내미 같은 붓도랑물 데리고
논둑에 선 조팝꽃이며 자잘한 꽃다지 냉이며 개불알꽃
하다못해 벌금다지며 머위까지
목숨 있는 것이라곤
모두 북 치고 소고 들고 상모 돌리며 꽃 피운
거뭉가니 들판을 가면
내가 물살 물굽이 물비늘 소용돌이까지 다 거느리고
참개구리며 물방개며 밀뱀 장구애비까지 거느린 붓도랑물 데리고
거뭉가니 들판을 가면
매어놓은 염소도 몽롱한 눈으로 나를 돌아보며
니가 저 아래 동실집 쫑마리 아녀? 물어보기도 하는
거뭉가니 들판을 가면
풍덩, 무엇이 물로 뛰어드는 소리에 돌아본
물 댄 논마다 하나하나 들어찬 달 위에 올라앉은
개구리들이 노래를 부르는
물꼬를 터놓아 철철철철 넘실대는 월인천강을 가면
― 송진권, 「나의 월인천강지곡」 전문
곽재구의 시에는 ‘민들레, 냉이꽃, 냉이꽃, 제비꽃, 산새콩, 꽃다지, 바람꽃’이 등장하고,
하얀 민들레 곁에 냉이꽃
냉이꽃 곁에 제비꽃
제비꽃 곁에 산새콩
산새콩 곁에 꽃다지
꽃다지 곁에 바람꽃
소년 하나 언덕에 엎드려 시를 쓰네
천지사방 꽃향기 가득해라
걷다가 시 쓰고
걷다가 밤이 오고
밤은 무지개를 보지 못해
아침과 비를 보내는 것인데
무지개 뜬 초원의 간이역
이슬 밭에 엎드려 한 노인이 시를 쓰네
― 곽재구, 「세월」 전문
내가 길 잘 든 순한 짐승 같은 붓도랑물 데리고
거뭉가니 들판을 가면
물 가둔 논마다 월인천강 월인천강
달이 들어앉아서 몸을 부풀리며 숨을 몰아쉬기도 하다
뽀드득 낯을 씻어내는 거뭉가니 들판을 가면
내가 쫑알쫑알 지껄이는 딸내미 같은 붓도랑물 데리고
논둑에 선 조팝꽃이며 자잘한 꽃다지 냉이며 개불알꽃
하다못해 벌금다지며 머위까지
목숨 있는 것이라곤
모두 북 치고 소고 들고 상모 돌리며 꽃 피운
거뭉가니 들판을 가면
내가 물살 물굽이 물비늘 소용돌이까지 다 거느리고
참개구리며 물방개며 밀뱀 장구애비까지 거느린 붓도랑물 데리고
거뭉가니 들판을 가면
매어놓은 염소도 몽롱한 눈으로 나를 돌아보며
니가 저 아래 동실집 쫑마리 아녀? 물어보기도 하는
거뭉가니 들판을 가면
풍덩, 무엇이 물로 뛰어드는 소리에 돌아본
물 댄 논마다 하나하나 들어찬 달 위에 올라앉은
개구리들이 노래를 부르는
물꼬를 터놓아 철철철철 넘실대는 월인천강을 가면
― 송진권, 「나의 월인천강지곡」 전문
곽재구의 시에는 ‘민들레, 냉이꽃, 냉이꽃, 제비꽃, 산새콩, 꽃다지, 바람꽃’이 등장하고,
송진권의 시에는 ‘조팝꽃, 꽃다지, 냉이, 개불알꽃, 벌금다지, 머위’가 등장하네요.
들꽃들이지요.
들판의 흙과 바람과 비와 붓도랑물이 키워낸 들꽃들이지요.
아무튼 시인들에게는 키가 크고 화려한 꽃보다는 허리를 굽히고 쪼그리고 앉아야 보이는 압정화, 앉은뱅이 꽃들에 눈길이 닿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낮은 시선으로 한 세월을 살아내는 족속들인가 봅니다.
그러니 저런 시편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일 테지요.
서대선 시인의 「꽃다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눈 내린 새벽
남의 집 살러가는
열두 살 계집아이
등 뒤로
눈 속에 묻히는
작은 발자국
멀리서 대문 닫아 거는 소리
― 서대선, 「꽃다지」 전문
이 시의 제목이 왜 꽃다지일까요?
눈 내린 새벽
남의 집 살러가는
열두 살 계집아이
등 뒤로
눈 속에 묻히는
작은 발자국
멀리서 대문 닫아 거는 소리
― 서대선, 「꽃다지」 전문
이 시의 제목이 왜 꽃다지일까요?
어떤 사연이 있어 ‘열두 살 계집아이’가 남의 집 살러가는 걸까요?
아무 말도 못 하고 대문 닫아거는 부모는 어떤 심정일까요?
새벽에 집을 떠나는 저 열두 살 계집아이와 꽃다지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시인은 덩그러니 그림 한 점을 펼쳐놓고는 아무런 부연설명도 하지 않는데,
내 마음은 왜 이리도 서늘한 것일까요?
민중엣센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꽃다지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꽃다지 1. [명사][식물] 오이, 가지 등에서 맨 처음으로 열린 열매.
꽃다지 2. [명사][식물] 십자화과의 두해살이풀.
민중엣센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꽃다지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꽃다지 1. [명사][식물] 오이, 가지 등에서 맨 처음으로 열린 열매.
꽃다지 2. [명사][식물] 십자화과의 두해살이풀.
산, 논밭에서 나는데, 줄기는 20~30cm이고, 온몸에 짧은 털이 빽빽하게 남.
봄에 노란 꽃이 줄기 끝에 핌. 어린잎은 식용함.
그러니까 꽃다지가 꽃 이름뿐 아니라 제일 처음에 열리는 열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다지가 꽃 이름뿐 아니라 제일 처음에 열리는 열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김진수 시인의 동시 「꽃다지」는 바로 처음 열린 열매라는 뜻으로 꽃다지가 쓰인 것이지요.
참 예쁜 우리말
처음 핀 오이꽃을 보고
할아버지께서
‘꽃다지’ 열렸네 하신다
처음 듣는 말이라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빙그레 웃으시며
너를 두고 하는 말이지 하셨다
사전을 찾아보니
맨 처음 열린 열매라 한다
아하!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내가 제일 처음 태어났으니
난 ‘꽃다지’구나!
― 김진수, 「꽃다지」 전문
오늘은 권정생 선생님 얘기로 시작했으니,
참 예쁜 우리말
처음 핀 오이꽃을 보고
할아버지께서
‘꽃다지’ 열렸네 하신다
처음 듣는 말이라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빙그레 웃으시며
너를 두고 하는 말이지 하셨다
사전을 찾아보니
맨 처음 열린 열매라 한다
아하!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내가 제일 처음 태어났으니
난 ‘꽃다지’구나!
― 김진수, 「꽃다지」 전문
오늘은 권정생 선생님 얘기로 시작했으니,
끝은 안동 사는 권정생 지킴이 안상학 시인의 시 「쌀 석 섬」으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권정생 선생은 평소 자신의 몸 상태를/ 멀쩡한 사람이 쌀 석 섬 지고 있는 것 같다 했다
권정생 선생은 평소 자신의 몸 상태를/ 멀쩡한 사람이 쌀 석 섬 지고 있는 것 같다 했다
/ 개구리 짐 받듯 살면서도
/ 북녘에서 전쟁터에서 아프리카에서
/ 굶주리는 아이들 짐 덜어주려 했다 그리했다
/ (중략)
/ 세상에는 짐을 대신 져주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
/ 그들의 삶은 하나같이 홀가분했다
― 안상학, 「쌀 석 섬」 부분
― 안상학, 「쌀 석 섬」 부분
'도서圖書Book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금주의 서평 669호] 미술관에 가는 날은...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보는 것도 좋겠다. (0) | 2024.03.13 |
|---|---|
| 고려의 명장 강감찬 장군 일화 (0) | 2024.03.13 |
| [금주의 서평 668호] 그 전세금엔 또 얼마나의 삶이 녹아 있을까?새창으로 읽기 (0) | 2024.03.06 |
| 이달의 책 소개 (봄내 398호, 2024년 03월) (0) | 2024.03.02 |
| [금주의 서평 667호] AI는 윤리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 : 윤리적 주체로서의 인간과 AI 공존의 방향새창으로 읽기 (0) | 2024.02.28 |
Comments